|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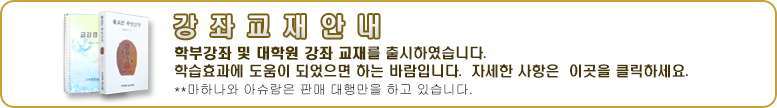
梵本 金剛經 第1品에 대한 解說
2013.07.01 01:25
梵本 金剛經 第1品에 대한 解說
이건준
(델리대 산스크리트학과 박사 졸업)
서 언
많은 종류의 경전들이 대승불교의 교리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한 경전들 중에서도 “金剛經(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은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운데 空(śūnya)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강경”은 여러 가지 판본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 판본들 중에서도 梵本(Sanskrit Version)은 모든 譯本들의 母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본 “금강경”은 다른 역본들처럼 32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품들 중에서 첫 품은 이 경전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첫 품에서는 교리적으로 주목할만한 내용을 느끼기 힘들지만 고대 인도의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스크리트본 경전들은 불교도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것을 후대에 문자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몇몇 문장들을 살펴보면 구어적인 요소와 불교혼성범어적인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이 문장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몇몇 단어들은 고대 인도 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불교적인 전통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범본 경전의 문장에 대하여 연구하기 이전에 범본 경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범본의 특징
불교 경전은 몇 차례 결집이후 현재까지 수 많은 종류의 판본들이 현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범본들은 대체로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본 금강경의 판본 또한 막스뮐러(M. Muller), 팔기터(F.E. Pargiter), 투치(G. Tucci) 등이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 발견한 것을 각각 1881년, 1916년, 1956년에 책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이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산스크리트 판본들은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만 할 것이다. 그 해답으로 대략 다섯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지리학적인 이유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산스크리트 판본들은 패엽으로 알려진 야자수 나뭇잎이나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패엽은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산간지대에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북부의 평야지대는 강가강과 여러 가지 강들로 인해 습하며 기온 또한 높다. 그래서 이 패엽이 오랜 기간동안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불교가 쇠퇴하면서 베다 전통을 고수하는 바라문들에 의해서 불교도들이 산간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주자들은 경전들을 가지고 산간지대로 이동했으며 남아있던 경전들은 바라문 수행자들에 의해서 소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12세기 이후 이슬람의 인도 침입이 본격화되면서 힌두교와 불교는 심한 탄압을 받았다. 특히 이슬람들은 힌두교와 불교의 성전들을 불태우는 것에 주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인도 북부의 평야지대에서는 불교 경전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넷째는 일부 힌두들에 의해서 불교서적이 소실되었다.
다섯째는 대승과 소승의 교리적인 대립 속에서 각자의 교리가 우수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서적을 소실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교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판본들은 대체로 인도 북부의 산간지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경전들은 고대 인도사회에서 바라문 계급보다는 주로 상인계급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필사자들은 야자수 나뭇잎이나 껍질에 경전을 필사할 때 더 많은 글자를 한정된 공간에 넣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노력들로 인해서 불교 경전은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는 아누스바라(anusvara)의 빈번한 사용이다. 고전 산스크리트(Classical Sanskrit)에서 사용된 n, ṅ, ṇ 등은 불교경전에서는 주로 ṃ(anusvara)으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아누스바라를 사용하면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글자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고전 산스크리트에서 사용하는 saṅga는 불교경전에서 saṃga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디(Sandhi)의 빈번한 사용이다. 글자와 글자 사이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산디현상을 적용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산디는 새로운 발음을 창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셋째는 문단의 줄이 바뀔 때 영어에서는 ab‘-’out으로 연결부호 ‘-’을 사용하지만 불교경전에서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연결 부호마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후대에 경전번역에 어려움을 증가시킨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지금까지 산스크리트본 불교 경전의 특징을 살폈다. 이러한 특징들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법적인 분석
1. “금강경”은 “金剛般若波羅蜜經” 또는 “能斷金剛般若波羅蜜經”의 약칭이며 범어로는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이다. 먼저 Vajracchedikā는 Vajra + (c) + chedikā로서 (c)는 편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산디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뮐러(Muller)는 Vajra를 금강석(Diamond)으로 번역했지만 싱하(Siṃha)는 번개(thunderbolt)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콘즈(Conze)는 뮐러처럼 금강석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경전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서는 ‘번개’로 해설하고 있다.
인도 사회 전통에 의하면 번개(불교에서는 金剛杵라고 부름)는 힌두이즘의 인드라(Indra) 신이 사용한 무기이다. 이 무기는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 이 전통이 불교에 흡수되어서 금강저(Vajra)는 무지를 파괴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hedikā는 ‘절단하는, 끊을 수 있는’을 의미하고 prajñā는 ‘반야, 지혜’로 번역한다. pāramitā는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문법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pārami + tā로 분석할 수 있다. pārami는 parama에서 나온 파생어로서 ‘수승한, 완성의’를 의미하고 tā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또 다른 시도로서 pāramitā를 pāram + i + tā로 분석하는 것이다. pāram은 para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완성’을 의미한다. i는 동사어근으로서 ‘간다’를 의미하고 tā는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이 두가지 분석을 종합해 보면 pāramitā는 ‘궁극적인 실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전의 제목은 ‘금강저(처럼 無知를) 끊을 수 있는 반야의 궁극적인 실체를 설한 경전’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2. 범본 금강경은 경전의 서두 부분에 간단한 만트라를 제시하고 있다. 뭘러본은 namaḥ sarvajñā로, 콘즈본은 namo bhagavatyai āryaprajñāpāramitāyai으로 되어있다. 싱하와 바이다(Vaidya)의 편집본에서는 namo bhagavatyā āryaprajñāpāramitāyai로 표현되고 있다. 뮐러본을 제외하고 다른 판본들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콘즈본은 bhagavatyai으로 산디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싱하本과 바이다本은 bhagavatyā으로 산디를 적용시키고 있다. 산디법칙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불교 경전의 하나의 특색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ārya이다. 대부분의 반야부 경전에서는 위와같은 만트라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야부 경전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반야바라밀께 귀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 앞에 수식어로서 ārya를 종종 삽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ārya는 형용사로서 ‘신성한’의 의미와 명사로서 ‘성인’을 의미한다. 물론 이 문장에서는 ‘신성한’으로 사용되었다.
반야부에서 말하는 성인은 누구인지 생각해 볼 만 할 것이다. 물론 소승불교에서 성인은 사향사과를 추구하는 자들을 지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일 것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금강경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 제7품에서는 無爲法에 정통한 자를 성인(ārya-pudgala)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이 경전에서 무위법의 특성을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니다’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와 상통하는 설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보살마하살은 ‘법과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무위법에 정통한 자는 보살마하살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곧 보살마하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만트라 다음에 본문이 시작한다.
3. 대부분의 경전은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evaṃ mayā śrutaṃ)’로 시작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에서 -m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뒤따르면 말음 m은 ṃ (anusvara)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디법칙이다. 그래서 evam은 mayā 때문에 evaṃ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m으로 끝나는 단어가 문장의 끝에 오면 말음 m은 변화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 śrutam은 m으로 끝나는 단어이지만 ṃ으로 변화하여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불교경전에서는 m으로 끝나는 단어가 문장의 끝에 나타나더라도 말음 m은 ṃ으로 변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 많은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일반적인 산디 현상을 따르지 않고 산디의 예외법칙을 다르고 있다.
하지만 불교경전이라도 불교학자가 아닌 산스크리트학자들이 편집한 경전에서는 아누스바라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바라문 전통에 입각한 고전산스크리트문법에 맞는 형태로 경전을 재편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베다 전통을 따르는 편집자(lipikara-paramparā)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mayā의 사용이다. mayā는 aham의 단수 기구격 형태로서 ‘나에 의해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aham의 또 다른 단수 기구격 형태는 me이다. 그렇다면 왜 산스크리트 경전은 시작하는 문장에서 me를 사용하지 않고 mayā만을 사용하는가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팔리 경전은 모두 evaṃ me suttaṃ으로서 me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 혼성 범어에서는 문단의 시작부분에서 me를 사용하지 않고 mayā를 사용하며 문단의 중간이나 후반부 에서는 항상 me를 사용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것이 고전 산스크리트와 차이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산스크리트에서는 단수 기구격은 mayā만 적용하고 있을 뿐 me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전 산스크리트에서는 me는 단수 여격과 소유격에서만 사용하지만 불교혼성 범어에서는 단수 기구격에서도 me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ekasmin samaye는 모두 a로 끝나는 명사어간에 단수 처격 어미가 덧붙여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격어미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eka는 a로 끝나는 명사어간이지만 이 단어가 대명사적 형용사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특수한 격어미를 부가시킨다. 파니니는 a곡용의 예외 법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sarvādīni sarvanāmāni (I-1-27)
(해석) sarva(모든)와 몇몇 단어들은 대명사적 형용사(sarvanāma)이다.
위의 문장은 sarva + ādīni + sarvanāmāni로서 분석할 수 있다. 부사 또는 수사의 몇몇 단어들이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이들은 특별한 격어미를 취한다. 이때 남성 단수 처격 어미가 -smin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amaye는 sam + √ay + a(e : 단수 처격)로서 분석할 수 있다. √ay는 동사 i(가다)의 파생형태이고 접두사 sam이 붙어서 ‘지나간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ekasmin samaye는 절대처격을 사용한 부사구로서 ‘(과거) 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Bhagavāñ śrāvastyāṃ viharati sma jetavane anāthapiṇḍaka ārame mahatā bhikṣu saṃghena sārddham ardhatrayodasabhir bhikṣuśataiḥ라는 문구를 살펴보자.
5. Bhagavāñ은 ‘존경할 만 한 (자)’라는 뜻으로서 인도 철학이나 문학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어떤 문헌에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이차적인 의미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내용상 ‘존경할 만 한 (자)’는 붓다를 의미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번역본에서 이 단어를 ‘세존(세상에서 존경할 만 한 자)’으로 번역하고 있다.
6. 그리고 viharati라는 단어를 주목할 만 하다. 이 단어는 vi + √hṛ + ti로서 분석한다. 동사어근 hṛ는 ‘가지다, 훔치다’라는 의미이고 접두사 vi가 덧붙어서 vi + √hṛ는 ‘분리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그러나 불교혼성 산스크리트에서는 viharati의 의미가 고전 산스크리트와 달리 ‘살다, 머물다,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의미론적인 분석으로 특히 불교 경전 속에서 붓다가 어떤 곳에 잠시 머문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viharati는 vihṛ + ti(현재 3인칭 단수)가 덧붙어서 ‘머물다’라는 현재동사가 되는데 모든 금강경 번역에서는 ‘머물렀다’로서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런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해답은 viharati 다음에 있는 sma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ma는 현재 동사 뒤에서 그 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진술하는 문장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금강경의 편집이 부처님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작은 흔적이다. 또 금강경이 구전되어 오다가 문자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7. 다음으로 anāthapiṇḍada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anāthapiṇḍada는 給孤獨으로 번역되며 a + nātha + piṇḍa + da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a는 부정어이고 nātha는 ‘부모가 있는, 의지할 곳이 있는’을 의미한다. 그래서 anātha는 ‘의지할 곳이 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자, 수행자’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piṇḍa는 ‘주먹밥’을 의미하고 da는 동사어근 dā에서 a가 탈락하여 행위자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anāthapiṇḍada는 ‘의지할 곳 없는 자(또는 불교수행자)에게 음식(주먹밥)을 주는 자’라는 글자그대로의 번역이 가능하다.
이 급고독 장자의 이름은 불교적인 색채를 띄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율장 대품에 의하면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을 친견했을 때 부처님은 그를 ‘급고독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수닷타(Sudatta)여’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급고독이라는 이름은 부처님 또는 불교수행자가 그에게 지어준 佛名임을 추측할 수 있고 本名은 수닷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가자에게 불명을 주는 것은 붓다시대 당시에도 있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8. 다음으로 ardhatrayodasabhir bhikṣuśataiḥ라는 문구를 주시할 만 하다. ardhatrayodasabhir bhikṣuśataiḥ은 ‘1250명의 비구’로 번역하고 있으며 ardha + trayodasabhir + bhikṣu + śataiḥ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ardha는 ‘절반’을 의미하고 trayodasabhir는 13을 의미하며 śataiḥ은 100을 의미한다. 그리고 ardha와 trayodasabhir는 śataiḥ에 적용되는 등위복합어로서 ardha-śataiḥ와 trayodasabhir-śataiḥ가 된다. 그래서 ardha-śataiḥ은 100의 절반으로 50이 되고 trayodasabhir-śataiḥ는 1300이 된다. 그러므로 ardhatrayodasabhir bhikṣuśataiḥ는 ‘1350명의 비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모든 번역에서 ardhatrayodasabhir bhikṣuśataiḥ을 ‘1250명의 비구’로 번역하고 있는데 위의 분석에서는 ‘1350명의 비구’로 해석된 것이다. 이 “금강경”은 구전되어 온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임은 앞에서 설명했다. 고대 인도인들은 숫자를 말할 때 습관적으로 ūna(적은, 감해진)라는 단어를 생략하기도 한다.
고전 산스크리트에서 이 ūna는 19, 29, 39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19를 nāvadaśa나 ūna-viṃśti(20에서 하나가 작은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불교경전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종종 이 ūna를 생략하는 것이 불교혼성범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혼성범어의 특징을 발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ardhatrayodasabhir에서 ardha와 trayodasabhir사이에 ūna를 생략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문구는 ardha-ūna-trayodasabhir bhikṣuśataiḥ로서 ‘1300에서 50이 적은’으로서 ‘1250명의 비구’로 번역되는 것으로 보인다.
9. 다음 문장은 부처님께서 스라바스티에서 탁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은 분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산스크리트 문법에서 분사는 동사와 명사의 문법 범주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 동작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예를들면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되돌아오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pratikrāmtaḥ(還至本處)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접두사 prati에 동사어근kram이 연결되어 새로운 동사어근을 만든다. 여기에 과거분사어미 ta가 부가되어서 이 단어는 형용사가 된다. 그러므로 형용사는 명사어미를 취하기 때문에 남성 단수 주격어미인 ḥ을 부가한 것이다.
그래서 pratikrāmtaḥ라는 단어를 통해서 행위자가 남성인 세존임을 알 수 있고 그가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분사 형태의 단어들은 설명하고자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분사의 빈번한 사용은 대화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iṇḍāya caritvā에서 caritvā는 동명사이다. 그렇다면 산스크리트 문법에서 동명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 파니니는 동명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amānakartṛkayoḥ pūrvakāle (III-4-21)
(해설) 한 행위자가 두가지 행동을 취할 때 동명사는 동사보다 선행되어 발생한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piṇḍāya caritvā은 탁발을 완전히 마친 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산스크리트 문법에서 분사는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동명사는 동사보다 먼저 완료된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전은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로 구성된 것이므로 대화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사와 동명사를 빈번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역사적 접근
1. ārama는 금강경 한역육본에서 동일하게 園으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본에서는 garde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원(garden)은 건물이 없이 평지에 잔디가 깔려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스라바스티에 있는 給孤獨園에는 여러 형태의 건물의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ārama를 정원이나 동산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ārama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자.
ārama는 ‘기쁨의 장소’라는 글자그대로의 뜻으로서 대체로 도시나 시읍 안에 있는 과수원이나 정원을 말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불교 경전 속에서 사용될 때 과수원이나 정원에 설립된 사찰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붓다 시대부터 비구들은 우기 때 두가지 형태의 거주처에서 안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거의 전통은 諸思想을 가진 인도의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승가가 화합하여 함께 머물렀던 곳의 초기 형태는 āvāsa와 ārama이다. āvāsa는 도시 외곽에 비구들이 직접 건설하여 안거를 행한 곳이고 ārama는 시주자가 설립하여 비구들에게 보시하여 비구들이 안거를 지낼 수 있게 한 곳이다. 그러므로 급고독원은 급고독 장자가 비구들을 위해서 지은 초기 형태의 사찰임을 추측할 수 있다. 율장 대품에 급고독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나타핀다카에 의해서 건설된 사찰에는 요사채, 객실, 법당, 우물, 목욕탕, 물탱크, 창고, 화장실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ārama는 정원이나 동산이라는 일차적 의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찰이라는 이차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우리는 불교 수행자를 比丘(Bhikṣu)라고 부르고 있다. 이 bhikṣu는 √bhaj(나누다, 바라다)에서 파생된 √bhikṣ(바라다, 구걸하다)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bhikṣu는 ‘걸식하는 자’라는 뜻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왜 불교수행자를 비구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생각할만 하다.
四門遊觀을 통해서 볼 때 싯다르타가 북쪽 성문 쪽에서 출가 수행자를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불교 이전에 출가 수행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 때의 수행자는 바라문이나 사문이었을 것이다.
고대 인도 사회에서 이러한 바라문 수행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음식을 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이 숲 속에서 수행할 때 일부 상위 계급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바라문 수행자들이 지내는 곳으로 가서 이 음식을 전달했다. 또는 바라문 수행자들이 몇몇 정해져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바라문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분제도의 차별을 보여주는 형태로서 수드라(Sudra) 계급의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지 않는 바라문 수행자들의 사회적 전통을 알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불교수행자들은 걸식을 행할 때 신분의 구분없이 음식을 받음으로써 바라문 수행자와는 다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분의 차별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며불교의 평등사상을 실천하는 행위로 보인다. 그러므로 바라문 수행자들인 산야시(saṃnyāsin)는 숲 속에서 머물면서 제한된 음식을 수용했지만 불교수행자들은 차별없이 음식을 받는다고 하여 비구(bhikṣu)라고 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으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닿는 예의를 표하다’라는 문장을 살펴볼 만 하다. 어른께 인사를 올릴 때 우리의 전통이 ‘큰 절’인 것처럼 고대 인도 사회에서 큰 어른께 인사하는 예법으로서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이 예법은 부처님 뿐만 아니라 모든 대단한 수행자나 스승께 아래 사람들이 인사하는 예법이지 특별한 종교 의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불교는 고대 인도의 여러 전통을 흡수하여 불교화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 증거일 것이다.
이 전통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간소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인도에서 아래 사람이 어른께 인사할 때 자신의 오른손으로 어른의 발가락을 닿고서 다시 자신의 이마에 손을 닿는다. 이것이 현대 인도에서 가장 극진한 인사법으로 정착하고 있다.
4.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세 번 도는 예의를 올리다’라는 문장을 눈 여겨 볼만하다. 불교 경전에서 제자들이나 재가자들이 부처님께 법을 구할 때 위의 방식으로 예를 올리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베다 전통에 의하면 신을 참배할 때 이 신의 상징물을 일곱번 도는 예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힌두적인 결혼식에서 이러한 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혼식 중에 아그니(agni) 신을 상징하는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옷자락을 엮은 채 그 화롯불 주위를 일곱번 도는 예를 올려야만 부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힌두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화롯불 주위를 최대 여섯번만 도는 예를 올린다. 이러한 결혼식을 건달바 결혼식이라고 지칭하고 이것은 전통에서 벗어난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베다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일곱 번 보다 적은 횟수로서 신이나 존경하는 자께 예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는 베다 전통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킨 인물로서 평가할 수 있다.
결 론
지금까지 범본 “금강경” 제1품에 나타난 몇몇 술어들과 문구들에 대하여 문법적 역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또 이에 앞서 범본 경전들이 히말라야 산간지대에서 발견되는 이유들을 간단하게 살폈다.
“금강경”에는 고전 산스크리트에서 사용하는 ṇ, ṅ, ñ, n을 아누스바라(ṃ)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단어와 단어사이나 문구와 문구 사이에서 산디를 자주 적용하여 한정된 공간에 많은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숫자를 설명할 때 고전 산스크리트에서는 9로 끝나는 숫자를 위해서 ūna를 사용했지만 불교혼성범어에서는 그 외의 숫자를 표현할 때에도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범본 “금강경”이 불교도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것을 후대에 문자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다. 또 이 경전이 순수한 산스크리트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교혼성범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들이다.
다음으로 vajracchedikāprajñāpāramiatā, bhagavan, viharati, ārama, ānathapiṇḍada, bhikṣu 등의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하여 글자그대로의 의미와 이차적인 의미를 파악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글자그대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들이 불교 경전에서 나타날 때에는 불교적인 특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차적인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글자그대로의 번역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차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좋은 예들이다.
마지막으로 인도 고대전통을 엿볼 수 있는 간단한 문구들을 살폈다. 이 문구는 출가자나 재가자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기 전에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부분을 말한다. 많은 경전들에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머리 조아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도는 예를 올리는 것을 자주 접한다. 이 예법은 베다 전통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베다 전통에서는 어른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일곱 번 도는 예를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일곱 번을 도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것으로 인도 고대 전통 곧 베다 전통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불교 전통은 여러 인도 전통을 흡수하여 나름대로 특성화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범본 금강경 제1품에 대한 내용 분석의 간단한 소개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금강경 전체에 대하여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열시의 談禪 법회 [14] | 관리자 | 2013.07.29 | 127550 |
| 공지 | महानव십호장을 권합니다आश्रम [10] | 책임교수 | 2012.07.12 | 133693 |
| 공지 | महानव열 숟가락 운동आश्रम [40] | 관리자 | 2012.11.20 | 171589 |
| 공지 | 자유게시판 사용안내 [11] | 관리자 | 2012.05.05 | 151886 |
| 272 | 미워하지 말고 잊어 버려라 ! [3] | 다니슬 | 2013.07.09 | 15998 |
| 271 | 행복의 조건 [2] | 다니슬 | 2013.07.08 | 15404 |
| 270 | 배우는 즐거움 [3] | 복돼지 | 2013.07.07 | 15711 |
| 269 | 깨끗한 행복 [2] | 다니슬 | 2013.07.03 | 15242 |
| 268 | 마 음 [3] | 다니슬 | 2013.07.02 | 15764 |
| » | 梵本 金剛經 第1品에 대한 解說 [1] | 빤디트 | 2013.07.01 | 19273 |
| 266 | 최교수님...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 빤디트 | 2013.07.01 | 16044 |
| 265 | 종강수업 ~ [3] | 해바라기 | 2013.06.26 | 15397 |
| 264 | 교수님의 강의시간은 "행복"입니다. [2] | 산이슬 | 2013.06.26 | 15247 |
| 263 | 내던지는 사람들.. [3] | 다니슬 | 2013.06.25 | 15455 |
| 262 | 종강,그리고... [2] | 산호초 | 2013.06.25 | 15963 |
| 261 | 부산 금불대 26기 남귀현입니다. [2] | 향기 | 2013.06.25 | 15628 |
| 260 | 시작이 반입니다. [2] | 산이슬 | 2013.06.24 | 15742 |
| 259 | 불교....딱 내스타일!!!!! [3] | 죽은시인의사회 | 2013.06.23 | 15894 |
| 258 | 부산 금불대 26기 하주희입니다 [2] | 하무애안 | 2013.06.22 | 15932 |
| 257 | 순수한 미소 [2] | 다니슬 | 2013.06.20 | 15272 |
| 256 | 인도이야기...전화 시스템의 변화 [3] | 빤디트 | 2013.06.20 | 15973 |
| 255 | 교수님~안녕하세요~^-^ [2] | 정혜숙 | 2013.06.19 | 15963 |
| 254 | 종강인사 [2] | 창수 | 2013.06.18 | 15793 |
| 253 | 방하착, 그 마음을 놓아라 [2] | 다니슬 | 2013.06.18 | 15230 |


올려 주신 글
정성스레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