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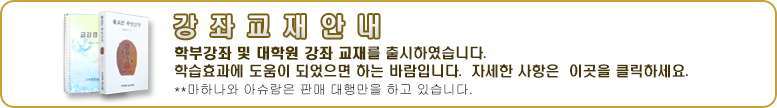
교수님의 강의 중 6애(六愛) 관련 설명을 듣고 나서
2017.02.28 09:25
교수님께서 번뇌를 설명하실 때 지적인 번뇌의 대명사가 무명[無明]이고 정서적 번뇌의 대명사가 갈애[渴愛]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정서적’이란 표현에서 느껴지듯 우리에게 보다 와 닿는 설명이 갈애에 관한 것일 것이며, 이를 통해 번뇌에 휘둘린 우리 존재의 모습이 얼마나 (무상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존재인가를 보다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증론 강의를 정리하며 교수님의 6ㆍ6법(六六法) 연기 지분 중 6애(六愛) 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중 꼭 그와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되었다.
(갈애(tṛṣṇā, 愛)지분은 12연기, 6ㆍ6법 연기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강의의 설명은 시작 단계인 6ㆍ6법 지분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강의는 [대학원] - [수증론] - [제36강]이다.)
- - - <6ㆍ6법 연기 지분 중 6애[六愛]에 대한 설명 - 교수님 강의 녹취 및 재정리> - - -
조금 덜 괴로운 상태에서, 더 괴로운 것에 비해 ‘즐겁다’라고 부를 만한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이 6애 단계다. 6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체(基體)가 있다. 그 기체의 상태가 다른 상태일 때보다 조금 덜 힘들고 덜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괴로움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괴로움이란 것은 참으로 생존체를 간사하게 만든다. 조금 덜 괴로운 것일 뿐인데, 그것에 대해 엄청난 집착이 가해지도록 만든다. 조금 더 즐거운 것에 대한 집착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듯한 맹목적인 강한 애착이 결국은 엄청난 것들을 희생하게 한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할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리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좋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에 대한 집착이 6애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때 가해지는 집착[/아집]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그래서 더 처절하다.
- - - - - -
이와 같이 애[愛](지분) 단계를 거치고 취[取], 유[有] 단계를 거쳐 결국 내가 태어났고[生], 나이가 들며[老] 살아가고 있다. 이런 존재를 가지고 영원해야 함을, 더욱이 즐거워해야 함을 스스로에게 요청하고 있으니, 내 존재의 가련함이 참으로 절실하게 느껴진다.


도반님. 옳은 말씀 고맙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