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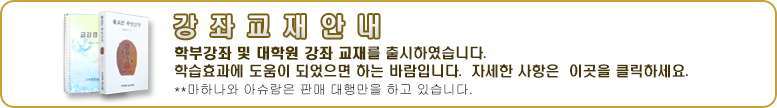
한역 금강경에는 사상(四相)을 설명하고 있다....
2015.02.24 11:39
금강경에는 사상(四相)을 설명하고 있다....
구마라집 한역 금강경에는 (1)자아의 생각(아상), (2)영혼의생각(인상), (3)유정의 생각(중생상), (4)개인의 생각(수자상)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산스크리트 금강경에 사상은 (1)자아의 생각(아상), (2)유정의 생각(중생상), (3)영혼의 생각(인상),(4)개인의 생각(수자상)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본과 한역본에는 왜 사상의 서술 순서가 차이가 있을까? 서술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일까?
부처님의 법문은 차제법문이고 법수대로 법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사상의 순서에서 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산스크리트 금강경에는구마라집 한역에서 相으로 통일적으로 번역하는 단어에 대하여 세가지 원어를 가지고 있다. lakṣna(相) saṃjñā(想) nimitta-saṃjñā(相想)......이세 단어들은 각각 相, 想, 相想으로 번역해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산스크리트 금강경에 나열한 (1)자아의 생각(아상, ātma-saṃjñā), (2)유정의생각(중생상, sattva-saṃjñā), (3)영혼의생각(인상, jīva-saṃjñā),(4)개인의 생각(수자상, pudgala-saṃjñā)은 (1)(2)가 짝을 이루고 (3)(4)가 짝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 시대에 (1)(2)는 브라만교의 대표적인 교설을 의미하고 (3)(4)는 자이나교의 대표적인 교설을 의미한다.
브라만교에서는 일체만물(sattva)은 자아(我,ātma)를 상징하는 창조신 梵(Brahma)이 창조했기에 일체만물은 사라질 수 있어도 창조신격에 해당하는자아(我, ātma)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브라만교의 창조론으로 범아일여(梵我一如)사상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은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창조신에 해당하는 범천의 다른모습인 자아(我, ātma)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유신론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아가 영원하다는생각과 유정이 영원하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명하셨다.
그리고 자이나교에서 인간은 숙명에 의해 영혼(jīva)와 개인(pudgala, 정신적 요소를 가진 육체)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두가지 요소들이 떨어지면 죽음이고 이 두가지 요소들이 결합하면 출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숙명론을 대표한다. 부처님은 이 숙명론을 비판하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하다는 생각과 개인이 영원하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이와같이 사상(四相)은 부처님 시대 인도 철학을 대표하는 두 사상(思想)인 유신론과 숙명론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교설에서 비롯되었다.
금강경은 초기불교 사상을 계승하고 대승불교 사상을 꽃피우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기존 인도철학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사상(四相)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열시의 談禪 법회 [14] | 관리자 | 2013.07.29 | 127223 |
| 공지 | महानव십호장을 권합니다आश्रम [10] | 책임교수 | 2012.07.12 | 133338 |
| 공지 | महानव열 숟가락 운동आश्रम [40] | 관리자 | 2012.11.20 | 171291 |
| 공지 | 자유게시판 사용안내 [11] | 관리자 | 2012.05.05 | 151592 |
| 408 | 바라보는 눈 [4] | 평생공부 | 2015.09.02 | 5897 |
| 407 | 이온화(부식) [4] | 평생공부 | 2015.08.29 | 6082 |
| 406 | 종교의례 [4] | 평생공부 | 2015.08.18 | 5826 |
| 405 | 울산 금불대 1학년입니다. [5] | daemi | 2015.07.15 | 6760 |
| 404 | 울산 금불대 12기 인사드립니다. [3] | 푸른하늘 | 2015.07.07 | 6906 |
| 403 | 부처님 오신 날 [3] | 백담거사장경진 | 2015.06.17 | 7328 |
| 402 |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에 동참하신 법우들을 찬탄합니다. [6] | 책임교수 | 2015.06.03 | 8798 |
| 401 | 스승님의 은혜 [2] | 적조 | 2015.05.19 | 9033 |
| 400 | 오늘은 스승의 날 입니다. [2] | 법륜거사 | 2015.05.16 | 8791 |
| 399 | 다시 한 번 To Sir With Love!! [2] | wongaksong | 2015.05.15 | 8596 |
| 398 | 교수님, 고귀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 바람소리 | 2015.05.15 | 8699 |
| 397 | 인도 네팔에는 왜 지진이 날까 [3] | 빤디트 | 2015.05.06 | 9078 |
| 396 | 네팔 대지진 [2] | 배대국 | 2015.04.27 | 8299 |
| 395 | 따스한 봄날 아침의 미륵보살님 [3] | 배대국 | 2015.04.24 | 9872 |
| 394 |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3] | 평생공부 | 2015.04.18 | 8930 |
| 393 | 체력은 국력이다? [3] | 부디스트 | 2015.03.15 | 11411 |
| » | 한역 금강경에는 사상(四相)을 설명하고 있다.... [2] | 빤디트 | 2015.02.24 | 14196 |
| 391 | 감사하는 마음으로. [6] | 부디스트 | 2015.02.15 | 12525 |
| 390 | 북부 인도 안개의 진실.... [6] | 빤디트 | 2015.01.25 | 15859 |
| 389 | 새해를 열면서-네팔 인도 여행 I. 축의 시대 이론과 카필라 국의 지정학적 위치 [8] | 책임교수 | 2015.01.01 | 18790 |


정진만이 해답인 듯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