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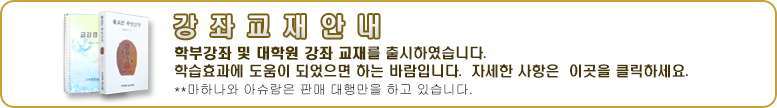
최봉수 박사님의 2013년 하반기 대구불교약사회 특강 2
2014.03.21 02:35
***약사회 생활 속의 반야심경 2회 특강***
제2회
그동안 어떻게 안녕들 하셨습니까? (일동 아주 힘차게 예!) 반갑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이해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현을 하든 또는 전문적인 수행가의 삶속에서 발현을 하든 반야라고 하는 요 덕목을 어떻게 정확하게 포착을 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됩니다. 반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만나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그냥 지혜라고 하면 안 된다. 지혜는 반야 중에 ‘야’의 뜻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앞에 ‘반’ 자가 붙었거든. 반 자는 말하자면 진행의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진행하는 지혜. 인도말로 하자면, 철자로는 프라즌냐라고 적지마는 우리말로 발음할 때는 (힘주어) 바~ㅇ야.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힘주어) 바~ 하는 말은 진행하다 나아가다 그리고 뒤에 즌냐 그때 j음은 묵음이기 때문에 야. 그게 반야에서 ‘야’입니다. 야가 지혜.
그래서 약사회 회원 여러분 정도 되면 반야가 뭐냐 하며는 지혜는 지혜로되 ‘진행하는 지혜’라고 하며 진행성, 그걸 딱 명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이라고 하는 것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반야 또는 반야부 불교 반야심경의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반야심경이 불교의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반야심경이 포함된 반야부 경전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전체 중에서 위치를 굳이 잡으라면 중간 정도에 들어있습니다. 반야부 경전 앞에 설해진 경이 있고 반야부 경전을 이어 설해진 경이 있는 거죠. 자세히 분별하면 8만 4천 가지로 분별이 되지마는 크게 분별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반야부 경전을 포함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르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첫 번째는 ‘벗어남’의 불교입니다. 불교의 시작은 벗어남, 벗어나라는 거예요. 처음 인제 불교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부처님은 뭐다?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아가라 그럽니다. 그것이 ‘나아감’의 불교입니다. 벗어나라 그러면 무엇에서 벗어나라는 말이고 벗어나고 나면 어디에 도달하는 거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드릴 게요. 그리고 나아가라 그러며는 어디를 출발점으로 해서 나아가라는 거며 그렇게 나아가면 또 어디에 도달하지? 곧 이야기해 드릴 게요. 그런데 문제는 벗어남의 불교 나아감의 불교로 불교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교의 마무리는 어떤 불교일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벗어나라 다음에 나아가라에서 벗어남의 불교가 아함경의 불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인제 초기불교 그래요. 한 번씩들 들어보셨죠.
초기불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이타가 아함경이라는 경이거든요. 아함경이라는 경 한 번씩들 들어보셨죠? 그래 아함경의 불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벗어나라 그럽니다. 그래 무엇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하니까 생사가 넘실대는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처님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실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해로부터 벗어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고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고해에 빠졌는가, 원인을 추적해야 되겠죠. 번뇌라는 게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번뇌에서 결국 벗어나는 게 고해에서 뭐하는 거다? 벗어나는 거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해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해라. 그래 고해에서 수행을 통하여 고해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의 근원인 뭐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면 어디에 도달하느냐? 벗어나서 도달한 장소를 ‘열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의 불교 초기불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행을 통하여 고해에서 벗어나 열반에 안착하는 과정, 이게 인제 초기불교다 아함경이다. 딱 끝납니다. 그걸 우리가 동작으로 이야기하면 뭐다? 벗어남의 불교.
그런데 벗어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열반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 열반은 절대적이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하여 고해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열반은 단지 초보적인 열반이요 열반의 시작이었을 뿐이지 궁극적인 열반은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교리가 쏟아지는 가르침이 우리가 공부하는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반야부의 경전은 바로 나아감의 불교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시작이죠. 나아감의 불교. 열반에서 뭐다? 더 나아가라. 열반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고 알아야 해. 나아가야 한다고 아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일동 반야). 그럼, 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반야의 뜻은 두 달 전에 와서 진행적인 지혜라고 그랬죠. 진행이 뭡니까? 나아가는 게 진행이죠, 우리말로. 나아가야 한다고 아는 것 어디에서조차? 열반에서조차도 머물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통찰하는 지혜가 뭐다?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감의 불교의 출발점은 벗어남의 불교의 귀결점이요. 벗어남의 불교의 귀결점이 나아감의 불교의 출발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스타팅포인트로 해가지고 반야의 힘에 의하여 나아가야 돼. 그러면 어디에 도달하겠죠. 도달한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 피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고해에서 수행을 통하여 열반에 도달한 과정은 뭐다? 벗어남이라고 부르고 열반에서 반야를 통하여 피안에 이르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나아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똑같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데 왜 하나는 벗어남이라 그러고 왜 하나는 나아감이라 하느냐? 하는 궁금증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제가 듭니까 안 듭니까? 하면 어째야 됩니까? (일동 웃으며 안 들어요.) 아~, 나는 진짜 궁금해 이런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제가 신이 나 이야기를 하지. 나는 안 궁금한데, 이런 표정으로 그래 앉아 계시며는, 허 참 나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맞추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약을 약사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지어주면 뭐합니까? 먹는 사람이 맞춰서 먹어줘야지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일동 큰소리로 궁금합니다.) 표정을 그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동 하하하!!!)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을…. (일동 으하하하) 벗어남이면 벗어남이고 나아감이면 나아감이지 왜 벗어난다. 나아간다 등으로 다르게 말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데서 좋은 곳으로 갈 때 벗어 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좋은 데서 더 좋은 데로 갈 때는 나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고해는 안 좋은 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반은 좋은 데죠. 그러니까 고해에서 열반으로 갈 때는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다? 위묵띠(vimukti) 그럽니다, 인도말로는. 우리는 해탈 그러죠. 해탈은 풀 解자에 벗어날 脫자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말로 하면 벗어남이야. 해탈이라는 게. 왜 해탈이란 말을 쓰느냐? 안 좋은 데서 좋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벗어남이야.
그런데 열반은 안 좋은 곳은 아닙니다. 더 좋은 데가 있을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서 더 좋은 데로 갈 때는 벗어난다 라는 말 안 합니다. 나빠서 벗어납니까, 어디? 역시 좋은 데지만 더 좋은 데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반야경의 불교는 결국 뭐다? 나아감의 불교에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피안으로 나아갔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불교의 끝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차안의 고해에서 마무리됩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안에조차 계속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더 나아갈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마지막은 ‘돌아옴’의 불교입니다. 이런 돌아옴의 불교를 이야기하는 경전이 무슨 경전이다? 법화경. 그리고 법화경은 화엄경과 정토경의 도움을 받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렇게 크게 대별해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가르침이 베풀어진다? 벗어남의 가르침. 다 벗어나면 어떤 가르침이 베풀어진다? 나아감의 가르침. 다 나아가면 어떤 가르침이 베풀어진다? 돌아옴의 가르침.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며는 벗어남의 끝이 나아감의 시작이요 나아감의 끝이 돌아옴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니 벗어남의 불교인 아함과 나아감의 불교인 반야와 돌아옴의 불교인 법화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한 줄기로 연결된 가르침이죠. 이렇게 한 줄기로 연결된 가르침을 뜻하는 말은 뭐냐? 일 불 승(一佛乘)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줄기 부처되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 중의 어느 하나를 떼놓고 공부하면, 반드시 연결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는 큰 낭패에 빠집니다, 불교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야경의 생활 속에서의 교훈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주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반야경만 떼놓고 이야기하면 그다지 의미가 없고 반야경 앞에 아함경의 벗어남의 불교가 있었고 반야경은 가운데를 연결시키는 과정이었지 이후에는 다시 돌아옴의 가르침인 법화․화엄․정토의 법문이 설해진다는 대전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반야경 공부를 하면 그건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달 전에 왔을 때에는 반야라는 단어에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오늘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만 벗어남과 나아감과 돌아옴이 결국에는 한 줄기 길이고 하나의 길이라는 거야. 한 길입니다, 이게. 한 길을 뜻하는 말이 일 승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함경에서도 나타나고 반야경에서도 나타나고 법화경에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차원의 불교를 공부하더라도 항상 한 길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속성이나 덕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길을 통하여 벗어나고 길을 통하여 나아가고 결국 길을 통하여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길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반야경에서도 성취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랬을 때 길을 잡는데 다섯 가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 걸음에 닿을 수 없으니 여러 걸음을 각오하라. 두 달 전에 했던 이야기죠. 그죠. 왜? 그 길은 짧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에 길의 시작과 끝을 모두 덮을 수 없어요. 수도 없는 길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공덕은 어디서 오느냐? 은근하고 느긋하고 끈기 있는 데서 온다 그래요. 불교는 파닥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득하게 밀어붙여야지. 기도도 진득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수행도 진득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법회고 경전공부고 참선공부고 뭐든 성취를 이루려면 어떻다? 한 걸음에 안 되니, 얼마를 걸어야 될지는 세지를 말아랍니다, 그냥. 가다보면 나오니까. 너무 급해. 조금만 하고도 어떻다? 왜 끝이 아니지? 목적지에는 언제나 도달하지? 그러니까 기도나 소구소망이 제대로 성취가 안 되는 거 겉애요. 진득하게 (밀어붙여야 돼.) 아주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장강의 물처럼 어떻습니까? 천천히 흐르지만 바다에 이르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께 첫 번째 메시지로 함께 음미를 했고 길을 가다가 장애에 봉착하거들랑 가만히 기다려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교훈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일동 다섯 가지.) 다섯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길도 아니고 세 길도 아니고 네 길도 아니고 한 길입니다. 벗어나는 길도 그 길이요 나아가는 길도 그 길이요 돌아오는 길도 그 길입니다.
왜 길이 여러 길이 아니고 한 길 뿐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은 답합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깐. 알겠습니까?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불교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고 빠르게 가야지 길이지. 어떻습니까? 그죠.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길 많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가서 어떻습니까? 88고속도를 타 광주까지 가. 광주에서 목포 가. 남해안 열차 타고 부산까지 와요. 그래 거기서 중앙고속도로 타고 춘천까지 올라가라. 춘천에서 경춘선타고 서울 가도 서울 가는 길은 맞아. 그런데 바쁜 사람은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KTX 타면 100분도 안 걸리고 서울을 가는데. 재미보고 여행하려는 사람은 그래 돌아 다녀도 되지만 바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바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가도 호상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동 하하하!!!) 저는 오늘 끝나면 고향에 내려갑니다. 부산이니까. 어머니 만나면 늘 말씀하셔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할머니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압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상여 알’이라고 불러요. ‘상여’ 있죠, 상여. 네모난 상여. 상여 알이래요. 알! 조금 있다가 상여 안에 다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지금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실하게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안전한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이 길이지.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무의미해. 그러니까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길을 잡았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게임은. 길의 문제에요, 결국에. 그런데 길을 잡았다 하더라도 자세는 필요하니까. 자세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본론은 오늘 나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길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겁니다. 누가 길을 가고 싶지 잘못된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들 좋은 길 빠른 길 길을 가고 싶지. 누가 옆길 샛길 장애되는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보면 장애되는 길을 가고 있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삥삥 도는 우회로를 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벗어날 때도 그 길이요 나아갈 때도 그 길이요 돌아올 때도 그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예, 안 가고 있습니까? 이제 가볼라 그럽니까? (일동 하하하!) 이미 길을 통하여 돌아왔습니까? (일동 하하하!)
길이 길이려면 세 가지를 봐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세 가지가 반야심경 안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갈 거예요. 왜? 그 길이 길이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아감의 가르침인 반야심경 안에도 그 길이 가진 공덕이 드러나야 된다 안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니까. 세 가지가 뭐냐?
I. 中道
첫 번째, 그 길은 중도(中道)여야 한다. 유일하면서 그리고 빠르면서도 안전한 한 길은 일단 어떤 길이어야 한다? 중도의 덕성을 갖추어야 돼요. 두 번째 그 길은 성도(聖道)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직접 주시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길이어야 한다. 세 번째 길은 정도(正道)여야 한다. 중도 ․ 성도 ․ 정도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 길이 우리가 의지한 바로 그 길이 아니냐. 오~! 일단 표현부터 그런대로 근사하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일동 느껴져요.) 느껴지죠. 이왕이면 중도로 가는 게 맞지. 이왕이면 거룩한 길, 좋아. 그리고 우리는 바른길 가야 안 되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 보고 중도라고 하는지 뭘 보고 성도라고 하는지 뭘 보고 정도라고 하는지와 관련된 정보가 우리 불자들에게 그렇게 제대로 입수되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중도 ․ 성도 ․ 정도하면 뭐해요. 뭐가 중도인지를 모르고 있고 뭐가 성도며 정도인지를 모르면 입으로 외운 것이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은 사람이 강 건너편을 보고 이리 오너라 오너라 한다고 강 건너편이 안 와요. 자기가 가야지. 중도니 성도니 정도니 하고 단지 외우기만 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은 강의 건너편을 불러서 이리 오라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가 중도이고 뭐가 성도이고 뭐가 정도인가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거는 옛날 말입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쓰시던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교경전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2600년 전 용어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는 발음은 같아도 뜻은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우리’라 그랬죠. 그 ‘우리’에 대한 이런 해석을 본 적 있습니다. 이게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아닙니다. 소 우리 닭 우리 할 때의 우리야. 그때는 우리가 그 뜻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뜻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거지. 그때는 보통명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쓰였던 때의 그 뜻이 어떤가를 추적해야 되는 거지. 마치 지금 우리가 쓰는 뜻으로 저 말 저 뜻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를 그냥 가운데 길, 성도를 그냥 거룩한 길, 정도를 그냥 바른 길이라고 하면, 이건 요즈음 우리시대 해석이고. 예컨대 ‘맛지마 파티파다’라고 하는 2600년 전 인도식의 중도의 뜻은 사뭇 달라요. 성도도 그렇고 특히 정도는 더욱 달라요.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중도냐? 2600년 전 언어인 중도를 21C 요즈음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바꾸면 중도는 요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바로 균형감각입니다. 요즈음 균형감각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일동 씁니다.) 쓰죠. 그죠. 요즈음 우리 쓰는 말이죠.
바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센스를 보고 중도라 그래요. 네가 가는 길이 오직 하나의 길이 되려면, 그 길이 균형감각이라는 덕목을 구현하는 길인가를 봐라 그래요. 균형은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 게 균형이죠.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말도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단순히, 공간적인 좌표상의 중앙을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균형점을 잡아낼 줄 아는 센스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균형감각. 그걸 고대에는 뭐라 그랬다? 중도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존재나 어떤 사건이나 그 존재나 사건에는 균형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탁자, 힘이 좋은 사람이 탁자를 들 때, 저 탁자 중에 어느 점에다가 손가락을 받히면 탁자가 딱 공중에 섭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점이니까, 거기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균형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균형점을 벗어난 지점을 손가락으로 받히면 다 넘어져 버리고 떨어져요. 못 갑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존재에나 다 균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바로 저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필시 성공합니다. 다 살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를 평가할 때도 참 약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한 다리로 서가지고 어떻다? 한쪽 발 양말을 벗고 그대로 신을 때까지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이고 넘어져 버리면 그게 오히려 노화가 진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이 건강하다 안 하다도 균형감각에 사실은 기인하는 바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살이도 똑 같고 수행도 똑 같습니다. 수행자가 균형감각을 잃어버리면 벗어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뭔 줄 압니까? 샛길로 빠지는 겁니다. 샛길로 빠지는 게 뭔 줄 압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지 마라 그래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거 같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도 트러 왔다가 돌아서 가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아무래도 종교계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번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덤벙대다가 벌어지는 어떤 불상사 중에 돌아버리는 경우, 하~! 많습니다. 그래 균형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 “중 도” 하는 이런 표현으로 불렀어요.
반야심경은 균형감각을 아주 중요시하는 가르침을 많이 베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야심경 오늘 외웠죠. 그 중에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여러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하니 도일체고액하나니라.(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그럼, 비추어보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죠. “조견?(照見)” 뭘 비추어봤다? 오온을. 어떻게 비추어봤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비추어봤다.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설명 좀 할 게요. 오온이라고 하는 말은 범부나 성자가 경험하는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존재나 사건을 오온에다가 대표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저도 오온에 들어가고 나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도 오온에 들어가고 앉아있는 바닥도 오온에 들어가고 책자도 다 오온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오온이 다 뭐하다? 공하다고 봐라. 여러분들 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우에 따라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원래부터 없었다”를 뜻합니다. 보통 없다는 무(無)라 그래요. 없을 무자 있죠. 보통의 없다가 뭔 뜻이냐 하면요 (분필을 들어 보이면서) 자 여러분 앞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분필을 없앤 뒤에) 방금 자리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던 게 없어질 경우는 무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없었으면 공 그래요. 그게 무서운 말이지, 공은. 그래 조견오온개공은 뭡니까, 여러분들. 오온은 모두 다 원래부터 없었음을 비추어 보았다. 말이 됩니까? 내가 원래부터 없어요? 내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라고 내가 받아들이지만 지금 잠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동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됩니까? (일동 하하하!!!) 실제는 뭐라고 돼있는 줄 압니까? 이거는 현장 삼장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 문장은 인도말로 하면 “판차 스칸닷.(Pañca skandhāḥ)” 물론 여러분들은 저 글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고 제가 지 마음대로 적는 건지 분간이 안 되겠지만 정확합니다. 우리 이런 것 가지고 이상하게 안 합니다.
판차 스칸닷. 판차는 뭐냐 하면 ‘다섯’이야. 스칸다가 온(蘊)으로 번역된 말입니다. 그런데 복수기 때문에 앗(āḥ)이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탕슈처 스와 바와 슌얀”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파슈야띠 스머” 한번 따라해봐요. “판차 스칸닷 탕슈처 스와 바와 슌얀 파슈야띠 스머”(tāṃśca svabhāvaśūnyān paśyati sma) (일동 판차 스칸닷 탕슈처 스와 바와 슌얀 파슈야띠 스머) 자, 오온은 판차 스칸닷의 번역이고, 개공은 슌얀의 번역입니다. 여기 복수기 때문에 앞에 다 개자가 들어가고, 슌야가 원래부터 없음을 뜻하는 공의 뜻이기 때문에 개공이고, 조견은 파슈야띠 스머가 조견입니다.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하려면 단어가 파슈야띠 스머 판차 스칸닷 슌얀 하면 끝나.
그런데 이 말, “탕슈처 스와 바와(tāṃśca svabhāva)”가 왜 들어가 있냐 이거죠. 번역 안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말(탕슈처 스와 바와)이 뭔 말인 줄 압니까? 그것의 자성(自性)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번역 말씀드립니다. “오온은 있는데 그것의 자성이 원래부터 없었음을 비추어보았나니라.” 이게 원문입니다.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현상적으로나마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인 자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없다? 싹 없다 생각하면 치우친 겁니다. 잠시는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있다를 영원히 있다고 집착해도 치우친 겁니다. 자성은 없으니까. 이런 게 불교거든요.
좀 이해가 갑니다. 워낙 심오하니까 그런 표정을 짓는 거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일동 하하하!) 그러니까 조견오온개공이라는 말은 치우침이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원래부터 없었다. 지나쳐. 지나치면 불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다 살려. 균형점을 찾아서 받히면 의자의 이쪽과 저쪽이 다 올라가죠. 균형점을 놓치면 둘 중 어느 하나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살리고 그렇지만 본성 자체가 없다는 뜻도 살리는, 오온은 있는데 자성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비추어 보았나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오온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무지막지한 이야기에서 벗어납니다.
부처님은 섬세한 분이십니다. 아주 artistically subtle 하신 분입니다. 예술적으로 미묘하신 분이죠, 부처님은. 절대로 무지막지한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상처 되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니가 경험한 거는 경험한 대로 있어. 그러나 경험 속에 알맹이는 원래부터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확률이 큽니다. 이게 부처님 접근법입니다. 알맹이는 본래부터 없었으니까 있다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잠시라도 있으니까 함부로 없다고도 하지 마라. 이 둘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얻으라고 가르친 게 조견오온개공의 원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원전비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오온을 공의 주어로 삼으면 안돼요. 오온은 있는데 자성은 공하다. 이래 봐야지. 되겠습니까? (일동 예!!!) 그러니까 반야부의 나아감의 불교에도 이런 균형감각으로서의 중도의 의미는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II. 聖道
두 번째 길의 성격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한 길이 되려며는 그건 반드시 성도여야 됩니다. 성도를 거룩한 길이라고 일단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건 요새 표현이고. 원래 성도라고 하는 말이 지니는 의미의 현대적 표현은 ‘목표의식’입니다, 여러분들. ‘목표의식!’ 중도가 ‘균형감각’이라며는 성도는 뭐다? ‘목표의식’
우리가 가는 길이 부처님께서 추천하는 길이 되려면 그 길은 그 자체가 강한 목표의식을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길은요 목적지가 있을 때만 길입니다. 아무리 잘 닦은 신작로라도 목표가 없을 때는 광야입니다. 길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전에도 했던 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그죠. 여행자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여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여행길은 즐거우세요? 우리가 걷는 길이 여행길이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목표의식입니다. 목표의식이 없는 여행길은 여행이 아니고 방랑입니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여행이 되어야 되지 방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한 금 쪽 같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방랑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길이 방랑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가면 여행길이니, 다시 말해서 목적지를 가지고 가면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다? 지 아무리 잘 먹고 호사를 한다고 해도 그건 방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뭐하고 사느냐?”가 아니고 “뭐 하러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뭐하고 사느냐에만 신경을 써요. 니 요새 뭐하고 사노? 이래 묻습니다. 低質들이야. 高質들은 어떻게 묻는 줄 압니까? 니 뭐 하러 사노?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수단에만 신경을 쓰지, 목표의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선호하는 고급 직업군만 노리지, 직업을 통하여 내가 무얼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아무도 관심을 안 써요. 뭘 해도 됩니다.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뭘 해도 그걸 통하여 얻은 재화로 내가 뭐하러 사느냐가 분명하면 이게 부처님이 추천한 성도고 그게 거룩한 인생입니다.
뭐 하러 사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니는? 그러지 말고요. 그죠. 의외로 사람들에게서 목적의식의 부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차로 어디 갈 때도 네비게이션에다 목적지를 찍고 갑니다. 한낱 차를 운행할 때도 목적지를 찍는 네비게이션을 갖다놓고 가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 인생에 네비게이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가. 아무데나. 그게 무슨 여행이야 방랑이지 말입니다.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반야심경은 바로 그 길의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반야심경 안에는 강한 목적의식이 하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를 추천한다면, 요것도 여러분들,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보지 않으면 쉬이 간파하기 어려워요. 한역 문장만 가지고 목표의식을 간파해낸다 그러면 명안종사(明眼宗師)다. 한역문장인 ‘조견오온개공’만 가지고 “오온은 있는데 자성이 공하다는 소리겠지.” 하고 누가 알아챘다면 눈 밝은 스승이겠죠. 그죠. 아이 조견오온개공 해 놨으면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해석을 하지. 누가 자성을 찾아서 해석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야심경 뒤쪽에 보면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하여 심무가애하고 무가애고로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菩提薩埵 依般若波羅密多 故心無罣碍 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 줄여서 이야기하면 보리살타가 의반야바라밀다 하여 구경열반한다. 요런 대목이 있죠. (일동 예.) 구경열반의 경지가 말하자면 인제 피안이에요. 요게 초보적인 열반이라면 궁극적인 열반은 구경열반 그래요. 열반 구경하러 다니는 것 하고 다릅니다. (일동 하하하!) 그래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며는 삼세제불…이 있어, 그죠. (일동 예.) 삼세제불은 의반야바라밀다하여 까닭에 고득 아뇩다라삼먁삼보리(三世諸佛依般若波羅密多 故得阿縟多羅三漠三菩提) 해놨죠. 이상 안 해요? 보리살타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는데 왜 한쪽은 구경열반을 얻고 한쪽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까? 이런 문제의식 가져본 적 없으세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는 똑같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똑같은 작업을 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과론적 사유입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해 봐요.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했으니까 구경열반이고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했으니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다. 그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맞지 안 해요.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구경열반을 얻고, 그런 뒤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까지 얻은 게 삼세제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세제불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은 걸 삼세제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줄 모릅니다마는 이건 종자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그럼, 콩하고 팥은 다르죠. 보리살타와 삼세제불은 다르다라고 보면 저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보리살타하고 삼세제불이 다릅니까? 보리살타가 삼세제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동 맞아요.) 보살이 도를 튼 게 부처님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있죠. (일동 예.) 콩이 팥이 됩니까? (일동 아니오.) 팥이 콩이 됩니까? 콩은 팥이 될 수 없고 팥은 콩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삼세제불과 보리살타를 다르다고 보면 보리살타는 삼세제불이 될 수 없고 삼세제불은 보리살타가 된 것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세제불은 누굽니까? 보살이 도를 완전히 이루면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 배우고 있죠. (일동 예.) 그럼. 그러니까 마땅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실은 문장이 이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리살타의반야바라밀다’와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이 두 가지‘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라고 돼 있느냐? 프라즌냐파라미타아슈리뗘위하라티(prajñāpāramitām-āśrityaviharaty). 다음에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부분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프라즌냐파라미타아슈리뗘(prajñāpāramitām-āśritya) 이것만 있고 위하라티가 없어요. 또 글자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번역에.
요 ‘위하라티(viharaty)’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아슈리뗘(āśritya)’하는 말은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슈리뗘만 있으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하고 딱 그치면 돼요. 그런데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 하나를 더해. ‘위하라티’라는 행동을 더해요. 다시 말해서 삼세제불과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니까 결과가 뭐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위하라티가 뭔 줄 압니까? 잠시 머무는 걸 보고 위하라티 그래요. 인도말에는 머물다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위하라티라고 하는 머물다가 있고 프라티 티 슈타-티 라고 하는 머물다가 있어요. 한 번 따라해 봐요. 위하라티. (일동 위하라티), 프라티티슈타-티. (일동 프라티티슈타-티).
여러분들이 금강경에서“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하면서 머물 주(住)자 쓰죠. 또 어떨 때는 “여시아문 일시 불주사위국기수급고독원(如是我聞, 一時佛住舍衛國祇樹給孤獨園)”하면서도 머물 住자 쓰죠. 두 주자는 원어가 달라요. “일시불주” 할 때는 “위하라티”를 쓰고 “응무소住이생기심”이니 “무住상보시”니 할 때 住는 프라티 티 슈타-티를 써요. 여기서 ‘위하라티’는 “잠시 머물다가 떠날 때의 머묾”이고 ‘프라티 티 슈타-티’는 “집착적으로 영원히 있겠다고 머물 때의 머묾”입니다. 그래요, 부처님은 어느 지역에 영원히 머무셨다? 아니면 잠시 머무셨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다? (일동 이동하셨다.) 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위하라티’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영원히 머물려고 집착하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머물지 마라고 가르치죠. 그때는 ‘프라티 티 슈타-티’입니다.
보리살타는 이 반야바라밀다에 도달하거니와, 도달한다는 말이 바로 ‘의지하다’입니다. 그리고 잠시 쉽니다. 잠시 쉬는 동안 뭘 경험한다? 구경열반을 경험하는 겁니다. OK. 됩니까? 그런데 잠시 쉬고 난 다음에는 말 그대로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일동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돌아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아감’의 불교가 끝나면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옴’의 불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열반에서 더 좋은 열반을 향하여 불자가 나아가 가장 궁극적인 열반이자 반야바라밀다의 경지에 도달하거들랑 도달하는 즉시 차안으로 돌아오라가 아니고 애써서 거기에 도달했으니까 잠시는 쉬어라 그럽니다. 잠시 쉴 때 반야바라밀다의 세계의 맛을 느낀 게 구경열반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열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푹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생구제하러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중생구제의 방편바라밀과 지견바라밀을 얻으면 그게 아뇩다라삼먁삼보리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뭐라고 했다? 삼세제불도 여기 반야바라밀다까지는 갔다가 돌아와야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는 뜻에서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三世諸佛 依般若波羅蜜多故 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한 겁니다.
급하게 진행된 이야기지마는 해야 될 이야기는 다 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목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그걸 통하여 삼세제불, 다시 말해서 성불하는 게 목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얻으면 그게 목적인 줄 알아요. 그거는 당면의 목적이고 반야부 경전도 역시 뭔가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인 이상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서 부처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뭐다?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버린 대목이 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당면의 목표는 보리살타에게 부과한 겁니다. 반야바라밀다까지는 일단 가라. 그리고 잠시 머물러서 구경열반을 즐기는 것도 좋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다?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돌아와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 삼세제불이 되어야 하나니라. 부처님이 되어야 하나니라. 이게 뭐다? 궁극적인 목표임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포괄적인 불교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반야바라밀다를 얻은 것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반야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마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타일랜드와 같은 남방불교도들이 열반을 얻은 것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아니겠냐 하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애요. 그러나 반야심경은, 자체에서 반야바라밀다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기 위한 경유지에 불과하지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심경 그러죠? 그러면 반야부 경전이 설하고자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설하는 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야바라밀다가 아니고 뭐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부처님 경전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뭡니까? 벗어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나아가면 충분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아감의 경전을 이야기할 때도 뭐다? 결국 돌아와서 뭘 얻어야 된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야지 목표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명문화시켜 놓은 대목이 저 대목이에요. 아시겠죠. 목표를 어디로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거룩한 길이냐 거룩하지 못한 잘못된 길이냐를 나누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된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여 성불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불자들은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나는 단지 열반에만 도달하면 된다? 아니다. 벌써 빗나간다. 잘못된 길이다. 수행에 장애가 되는 장도(障道)다. 반야바라밀다 속에서 구경열반을 성취하면 되지 머. 아니다. 이미 텄다. 돌아버린다, 그거는.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어서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지위에 오를 때까지 불자의 진행은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부처 새끼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자 할 때 자(子)자는 제자 자자가 아닙니다. 아들 자잡니다. 원어가 푸티야(puttiya)입니다. 사리불(舍利弗) 할 때게 사리자(舍利子)라고도 하죠. 푸트라는 아들을 뜻해요.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아들은 나중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끝나지요. 부처의 아들은 앞으로 뭐가 되어야 끝납니까? 부처님이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표의식이 살아있으면 여행길이요 목표의식이 죽어있으면 그거는 방랑길이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여 나도 무상정등각을 이루어야겠어. 그래서 부처님이 되어야만 하겠어.”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이죠. 제시간에만 가면 좋겠다. 이런 목적의식. 끝나고 꼴깍 안 하나? 이런 거. (일동 하하하!!!) 궁극적인 목표의식은 우리불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벗어남의 과정이었든 나아감의 과정이었든 돌아옴의 과정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뭐여야 한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한 성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게 바로 뭐다? 성도의 메시집니다. 목표의식.
Ⅲ. 正道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할 그 길이 갖추어야 될 조건은 뭐다? 정도(正道). 바른 길. 뭐가 바른 걸까요? “정의란 무엇인가”해가지고 하바드 대학의 모교수 아주 책도 많이 팔아먹고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그죠. 뭐가 옳은 것이며 뭐가 바른 것인가 참 정의하기가 어려워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들도 행동을 하거나 판단할 때 이게 바른 행동인가 바른 판단일까 헷갈릴 때도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부처님은 한마디로 답을 줍니다. 뭐가 바른 거냐? 정도의 해석! 공개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공개주의. 뭐가 바른 거냐? 남에게 공개할 수 있으면 바른 겁니다. 숨기고 싶으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올 때 누구 만나 “어디 가냐?” “어, 오늘 약사불자회 법회가 있어 법회하러 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동 있습니다.) 그런데 춤추러 갈 때는 (일동 하하하!!!) “나 춤추러 가.” 그게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 가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그거 벌써 나쁜 짓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헷갈릴 때는요 남한테 드러내도 괜찮겠냐 안 괜찮겠냐 그것만 봐라 이겁니다. 왜? 바르다라고 해석되는 말의 원어가 삼약(samyak)입니다, 여러분. 삼약드리쉬티(samyag-dṛṣṭi) 정견(正見) 삼약쌍칼파(samyak-saṃkalpa) 정사유(正思惟)…. 초기불교에서도 삼약이라고 하는 말을 바를 정자로 다들 해석을 하는데, 인도언어사에 있어서 후기에 오게 되면 바를 정자로 고정됩니다마는, 우리 부처님은 인도언어사의 초기 언어시대에 사셨어요. 그래서 베다어(Veda語)라고 하는 아주 고대어 전통을 가지신 분입니다.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에서는 삼약이 ‘바르다’이지마는 베다어에 가게 되면 이건 바르다의 뜻보다도, ‘공개된 것’의 뜻을 가집니다.
왜? 삼약은 한 단어가 아니고, 베다어에 가게 되면 ‘삼(sam-)’이라는 단어와 ‘약(yag, añc)’이라는 단어로 나뉘어버립니다. 이 때 ‘약’은 ‘(~을) 향하다.’ ‘삼’은 ‘함께’, 다시 말해서 “함께 모인 것을 향한 것” “전체를 향한 것”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게 나중에 바르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바르다라고 판단 받으려면 뭐다? 전체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를 봐라. 전체에게 공개해도 떳떳하면 전체에 있어서 바른 겁니다. 더 큰 전체에 공개해도 떳떳하면 그건 더 큰 전체에 바른 거지. 항상 드러내고 살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다? 안 좋아요. 대개 비밀은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죠. 공개할 수 없을 때 벌써 거기에 뭐다? 번뇌가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탁.
여러분은 반야심경이라는 경을 아마 조석으로 외울 겁니다. 어느 대목이 그렇게 마음에 듭디까? 대목이 있습디까? 저의 스승이셨던 고익진 박사님은 무안(無眼)이라고 하는 글자에 걸려 3년간 화두로 삼아 도를 이루셨다 그래요. 무안이비설신의 있죠. 눈이 없나니라. 어~, 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지? 탁 걸려 3년간 식음을 전폐하고 몰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요. 사람마다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동 아하하하!!!) 아까도 외웠죠. 외우면서 나는 대목이 그래 좋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없어요? (몇몇 회원들 있어요.) 뭐가 그래 마음에 와 닿아요, 반야심경을 읽을 때마다? 그 대목만 가며는 참 뭔가 느끼는 바가 만만치 않아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면, 이거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벌써 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한 10분 더해도 되죠. (일동 예. 저희들은 좋은데 선생님이 문제죠.) 나는 차 늦게 끊었어요. 부산 가는 데 머. 저녁 11시 30분 찬가 11시 40분 찬가 부산 가는 막차 끊었어요. 아~, KTX 있어서 좋아요. 그거 타면 40분도 안 걸려가지고 부산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이상해요, 기분이. 이거 이래도 되나? 속은 거 아닌가? 부산 맞나 싶어요.
제가 반야심경을 볼 때 반야심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마음이 쏙 빠지는 대목은 요대목입니다, 저는. 옳지!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하여 심무가애하고 무가애고로 무유공포하나니라.(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 心無罫碍 無罫碍故 無有恐怖) 두려움이 없나니라. 세상살이요 가면 갈수록 무서워집니다. 저 보면 겁 많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세상살이? 아직 쓴맛을 못 봤구만. 아~! 무섭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은 모든 공포를 제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느니라. 무유공포하나니라. 아-트라스토(a-trasto), 떨지 않느니라. 그 길을 가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죽음이 앞에 와도 떨지 않고 무슨 경우가 앞에 와도 어떻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야 종교라 그래요. 하나가 예언자적인 기능, 앞날을 예측하는 게 종교의 기능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제장적인 기능, 공포 앞에서 공포를 위로해주는 기능을 사제장적인 기능이라 합니다. 종교가 종교일 수 있는 것은 두려움 앞에 떠는 자에게, 이런 두려움이든 저런 두려움이든 물을 만나서 물의 두려움이 되었든 불을 만나서 불의 두려움이 되었든 병을 만나서 병의 두려움이 되었든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두려움이 되었든 두려움 앞에 떠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움을 만져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기능을 뭐라 그런다? 사제장적인 기능이라 그럽니다.
불교도 종교인 이상, 불교라는 종교의 경전인 반야심경도 종교의 경전인 이상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제장적인 기능을 해야 돼요. 공포 앞에서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유공포하나니라. 참 내가 매달리고 싶은 단어예요, 저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거는 개인의 1인칭 당사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몇 번 아주 심각한 공포 앞에 직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반성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종교가 나에게 사제장적인 기능을 하는가? 이 기능을 하지 못 한다면 나는 불교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내가 믿는 불교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 생각했어요.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황망한 가운데 어떻다? 한줄기 빛이 되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아! 반야심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유공포하나니라. 어떻게 하며는? 심무가애하면. 무가애 고로 무유공포잖아요. “마음에 가림이 없으면” 두려울 게 없느니라고 내리친 겁니다. “공개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심무가애가 뭐예요? 마음에 가림이 없다 잖아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니가 부처님 앞이든 니 가족 앞이든 세상 앞에 니 마음에 가림이 없다면 다 드러내놓고 떳떳할 수 있다면, 내가 약속 하마. 너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뒤집힌 생각이 해결될지니 궁극적인 열반을 누릴 것이니라 하고 계십니다. 심무가앱니다, 여러분. 정도입니다. 공개주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반야심경이라는 것이 우리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다른 경전과 다르다면 열반에서 더 좋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라는 특색이 있지마는 그래봤자 그것도 한 길의 이야기이니 결국 메시지는 항상 세 가지로 축소됩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살아라. 목표의식을 잃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공개주의에 입각한 삶을 살고 판단하라. 남한테 드러내서 부끄러울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그럼 끝납니다. 내가 이런 생각했다면 남들이 웃겠지 하면 하지 말아버려요. 아시겠죠. 가족 앞에 동료 앞에 그리고 우리 회원여러분들 앞에 항상 드러내놓고도 당당하고 떳떳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 일만 여러 가지 골라서 골라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공포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부처님은 공개주읩니다. “여래에게는 사권(師拳)이 없다.” 손바닥 안에 아주 1급 비밀 적어놓고 내 죽고 나면 펴봐라 하는 인도 스승들의 관습이 있어요. 왜? 미리 가르쳐주면 배신하니까. 그걸 사권 스승의 주먹이라 그래요. 여래는 주먹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왜? 나는 숨겨놓은 거 없다. 내 살아생전에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스승과 도반과 함께 도량에서 공부하라. 공부가, 여러분들 자폐되고 은폐되면 안 됩니다. 생각은 혼자 하지마는 항상 공개해 내 생각이 어떤가를 뭐다? 공개해라. 그야말로 공개해야지,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길이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마음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굴속에서 걸어가 봐. 급기야는 뭡니까? 팽 돌아서 오든지 싹 돌아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납니다. (일동 하하하!!!) 그래서 공부하고 보름 마다 꼭 모여 내 이런 공부했는데 어때? 하고 공개를 꼭 합니다. 스승 앞에 드러냅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뭡니까? 아뇩다라삼먁삼보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동 예!) 뭘 아셨어요? (일동 으하하하!!!) 오늘 이야기 다 끝났다는 걸 아셔야지. 뭘 그렇게 더 바라는 표정으로 앉아계세요. 아시겠죠. (일동 예!) 우리 두 번의 시간동안 너무 욕심낼 거 없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중도 균형감각 또 성도 목표의식 다음에 정도 공개주의. 이게 우리가 걸어도 안전한 길이다.
길을 가되 한 걸음에 닿을 수 없으니 여러 걸음 각오할 줄 알고 그 길을 가더라도 혹여 장애가 발생하면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여유만 부릴 수 있으면 급기야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부처님도 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반야심경 속을 또 반야심경을 계기로 함께 나눌만한 이야기로 저는 격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우~ 아~! 휘파람 불고 난리났음. 매우 열렬하게 쨕쨕쨕쨕~!!!!)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다!
※이글은 최봉수 교수님께서 2013년도 하반기에 2차례에 걸쳐 대구불교약사회에서 특강한 내용입니다. 혹여 잘못된 부분은 녹취한 저가 잘못 듣고 잘못 기록한 것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양해바랍니다.
삼가 보승 합장
댓글 9
-
부디스트
2014.03.24 10:06
-
거불회김종수
2014.03.24 22:15
세상살이
------------
세파에찌들린우리네인생~
상따라가네그려~
살금살금엉금엄금~
이제그만쉬었다가세나~
보승님 글 고맙습니다._()_
-
배대국
2014.03.25 07:23
교수님께서 직접 강연을 하시는 듯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보승법우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영정인
2014.03.28 11:49
기분 좋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운이 있는.....
보승법우 정말 와....... 행복한 고생 하셨내요.
-
복돼지
2014.04.05 09:59
가만히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ㅎㅎ
고맙습니다.
-
무명
2014.04.05 10:06
보승법우님,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전법도
2014.04.11 04:57
보승법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가끔 읽어보게 됩니다.고맙습니다.
-
법륜거사
2014.07.08 01:50
보승 법우님!
반갑 습니다 보승 법우님을 마지막 본 것이 언제인지 수년의 세월이 지나갔죠?
법우님이 어디에 있던지
“마하 나와 아슈람” 수행원 이 있으니 항상함께 있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정진 또 정진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
백담거사장경진
2014.09.18 00:00
도반님. 고맙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백담 합장


근래에 교수님 법문을 잘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프린트해서 열심히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